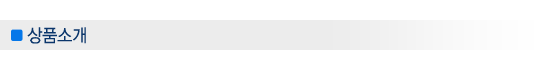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되짚으며 순교자 공경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 성지와 성지 순례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책은 초기 교회의 박해 과정과 순교자 공경의 다양한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교자 공경의 의미와 지향점을 탐구한 글이다. 타 종교와 학계, 일반의 의문에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와 기록을 통해 답하며, 교회 내부의 논란도 편견 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제1장에서는 박해와 순교의 전개 과정을 다루었다. 초기 교회의 박해 과정을 정리하며 박해의 대상과 목적 등을 살피고, 순교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순교 이해의 흐름을 짚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통해 박해의 존부, 박해의 원인 및 대상 등에 대한 의문과 질문에 답하였다. 또한 박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자들의 두 가지 태도, 즉 순교와 배교에 관한 당대 교회의 논란과 대처 방식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박해가 일반적으로 상상되듯 로마 위정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더욱 복합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박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활동으로서의 순교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순례, 유해 공경 등 다양한 순교자 공경 방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전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과 신학적 수용 과정 등을 다루었다. 순례, 유해 공경, 성화상 공경 등 순교자 공경은 순교자를 공동으로 기억하는 일이며, 순교자를 따르려는 열망이 담긴 행위이다. 전구를 넘어 통공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파 지역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공경 양상에 있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주는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으며 교도권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교회는 성화상 공경 등이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 형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이미지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에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임을 천명한다. 특히 성모 마리아와 성인에 대한 공경과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을 구별함으로써 순교자 공경이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행위로 기능함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순례와 성지, 순교와 순교자 공경 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하였다. 교회 전례의 궁극적 목적은 흠숭의 예배로서, 순교자 공경의 신학적 전개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순례와 관광은 다르지만, 하느님을 향하는 진심이 있다면 관광도 순례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박해를 견디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한국의 순교자 공경 양상은 선교사가 주도한 현양 과정과 구별된다. 이는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심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교도권은 순교와 순교자 공경에 대한 정도를 제시하였지만 대중신심의 원천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결국 성지 순례를 포함한 순교자 공경의 바탕에는 순교자의 용기와 하느님의 은총을 기리는 마음이 있으며, 이는 역사적 성찰을 통해 개인의 신심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록으로 실린 세 글은 성지의 의미에 관해 더욱 천착함으로써 성지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순례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해미신앙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접한 문제를 마주하며 풀어낸 고민과 해석이 돋보인다.
박해와 순교의 생생한 기록을 가진 한국 교회에게 이 모든 질문은 과거에 관한 회상이나 안락의자에 걸터앉아 나누는 담소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느님의 역사 내 현존과 구원이라는 렌즈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순례지는 어떻게 가꾸고 순례지를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순례자의 발과 눈과 마음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러한 역사 자료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43쪽.
성지순례를 포함한 순교자 공경은 인간으로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랐던 신앙 선조들의 삶과 신앙 앞에 우리를 세운다.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순례는 그들을 통해 활동하신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 존재와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길어 올리는 시간이다. 순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행이지만, 순례 이전과는 다른 나로서, 순교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순교지로 만드는 변화의 씨앗을 우리 손에 쥐어준다. --2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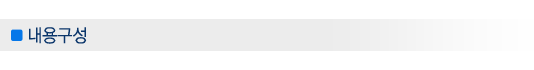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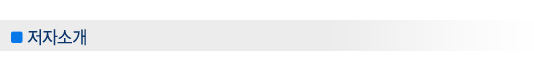
글쓴이 : 권영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A,N.Whitehead의 신관 연구-그리스도교 신관의 관점에서」, 2000), 박사(『E.Schillebeeckx의 신학에 나타난 신앙의 역사적 역동성』, 2021)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학교에서 ‘신앙과 과학’을 강의했고(2002-2003), 미국 Claremont에 소재한 Center for Process Studies에서 Visiting Scholar로 활동했다(2004.1-2005.8). 스힐레벡스와 M.D.Chenu의 신학과 순례와 순교 및 선교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해미신앙문화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