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앙의 새벽길을 떠난
세 순례자의 이야기
초대 조선대목구장(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을 다룬 한수산 작가의 순례기이다. 이 책은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걸으셨던 길들, 작가가 직접 찾아간 시완쯔와 마찌아즈 교우촌, 롤롬보이의 오늘날, 신학생 최양업과 함께했던 김대건, 최방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특유의 필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신자들을 향한 두 사제의 마음을 되살려 낸 한수산 작가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험난한 시대를 관통한 그들의 여정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따뜻한 필체로 풀어 쓴
작가 한수산의 신앙 새벽길
소설 『부초』와 『유민』의 작가, 생명의 가치에 대해 탐구하며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체로 호평을 받았던 작가 한수산. 언제부턴가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영원히 이곳에 머무를 것처럼 일하면서, 곧 떠나갈 사람처럼 준비하게 하소서.”
이는 초대 조선대목구장(조선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 “지금부터,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일하면서 곧 떠나갈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적은 것을 작가가 마음에 품으며 했던 기도이다. 한 작가가 바치는 기도의 시작과 끝, 신앙을 키워 가던 중에 정권의 폭압으로 고초를 치렀던 작가, 그 악몽을 잊기 위해 한동안 고국을 떠나 살아야 했던 작가가 따서 만든 기도문은 그가 미뤄 두었던 글들을 모아 다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 계기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백두산에서 세례를 받은 한수산 작가는 한국 교회사의 흔적을 만날 때마다 감동과 숭고함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순교자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바랐다. 그렇게 그는 작가 특유의 따듯하고 섬세한 필체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한국 가톨릭의 새벽길을 가는’ 자신만의 여정을 출발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서울대교구 구요비 욥 주교는 “짙은 어둠과도 같은 시련이 무겁게 내리깔린 새벽길”을 걸었던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그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작가로서의 사명과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 한수산 작가의 글에 “기쁜 마음으로 (희망의) 빚을 져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신앙의 힘을 이 책에서 찾아볼 것을 독자들에게 권했다.
한수산과 함께 떠나는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새벽길
초대 조선대목구장, 조선 선교에 관한 교황의 권유마저 외면하려 했던 소속 전교회에 작심하고 비판문을 써 내려가며 복음에 충실하고자 했던 선교사,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선교를 담대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순례자, 이역만리 내몽골 열하성에서 조선으로의 입국을 앞두고 갑작스레 주님의 곁으로 간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한수산 작가는 브뤼기에르 주교를 기리는 이들과 함께 얼핏 보기에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것 같은 그의 여정을 첫 번째로 톺아본다.
“주교님의 여로가, 거기 담겨 있는 정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하는가. …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운명을 자신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연히 죽음의 길에 올랐던 한 사제의 영혼, 그 정신의 거룩함, 거기 오늘의 나를 비춰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브뤼기에르 주교의 그 정신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를 가슴에 새기는 것만이 그분의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가는 길은 아닐까.”
_2부 중 1. 브뤼기에르 주교, 그분은 누구인가, 44쪽.
그러나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정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한수산 작가가 떠난 여정도 성지 순례를 얼마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떠남이 주는 희망과 설렘이 예상치 못한 난관과 사고의 부침에 뒤엉킨 작가의 에세이는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관광버스 안에서 작가의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베이징을 출발해 시완쯔와 장자커우를 거쳐 츠펑과 마찌아즈까지 브뤼기에르 주교가 알지도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향해 걸었던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결연하게 나섰던 그 길을 작가는 직접 밟아 가며 걷는다. 옛 선인의 삶을 찾는 길은 언제나 아쉬움과 회한으로 덜컹거리지만, 그 뒤늦은 감동이라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공경과 추앙을 비로소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한 이들이 있어 그 여정은 더욱 복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천국의 길’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는 여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수산 작가는 얼핏 실패로 보이는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정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힘주어 설명한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을 향해 떠나며 보낸 편지에 “조선에 도착하면 … 성교회의 경계를 넓혀 나갈 조선인들을 사제로 서품할 것입니다.”라고 남긴 그의 의지가 끝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교님은 결국 이 일까지도 해내시지 않았는가! 그분의 고귀했던 뜻과 고난이 영글어 열매가 맺히고 … 선종 후 20년이 지난 1845년 성 김대건 신부는 상하이에서 한국 최초의 사제로 서품되지 않았는가.”
_2부 중 6. 100여 년이 흘러서… 유해가 돌아온 길, 123쪽.
한수산과 함께 떠나는
최양업 신부님의 새벽길
한수산 작가의 두 번째 여정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새벽길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은 신학생 최양업을 따라 압록강에서 시작해 마카오와 필리핀 롤롬보이로 이어지는 여정을 쫓는 작가는 훗날의 몰이해가 가져온 오류와 자신이 세운 또 다른 가설 사이의 경계를 들뜬 마음으로 오가고 뛰어넘는다.
마카오로 향하던 최양업 일행의 유학길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점, 수치스러운 추문을 남기고 조선을 떠났던 유방제 신부에 관한 제언提言, 역사적 사실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고증과 추측에 던지는 조소 등 한층 더 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야기의 씨실과 날실을 작가는 종횡무진 직조한다. 그렇게 잘 짜인 명징한 이야기들은 마법의 양탄자가 되어 독자들을 압록강과 변문(비앙멘)으로, 홍콩에서 마카오로, 필리핀 롤롬보이의 망고나무 아래로 인도한다. 그렇게 떠나가 닿은 곳에서 작가는 170년 전의 최양업과 일행을 만난다.
“풀이 시들고 말라 있지만 봄이 오면 초원으로 변할 구릉들을 바라보았었다. 신학교로 가는 세 소년도 저 산을 바라보았겠지. 그들이 바라보았을 산을 나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한순간 눈앞이 흐려지며 시간의 넓이를 넘어서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던가.”
- 3부 중 2. 길은 안개 속에 묻히고, 150쪽.
“내가 마카오 취재 여행을 6월로 계획한 것도 그들이 이곳에 닿았던 때와 같은 계절의 마카오를 밟음으로써 그들의 체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바라보던 햇살, 그들이 맞았을 비와 바람, 더위 속에 그들이 흘렸을 땀을 느끼고 싶었다.”
_3부 중 3. 6월에 찾아간 머나먼 그곳 , 160쪽.
“자신을 가르치던 신부님들과 함께 와서 최양업과 김대건이 지냈다는 이곳.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들었던 새소리와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다. 이것 또한 시간이 허물 수 없는 원형질이다. 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강물이 소리치며 흐르는 소리가 어찌 변하겠는가. 길고 긴 세월을 건너가, 그들이 들었던 소리로 똑같이 우짖는 새소리를, 그때와 똑같이 강변의 풀을 쓸고 가는 물결 소리를 들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그저 기뻤다.”
- 3부 중 5. 마카오를 떠나서, 221-222쪽.
170여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한수산 작가의 감수성은 한 곳의 이야기를 그저 그곳에 멈춰 둔 채 끝나지 않는다.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의 이야기는 어느새 작가가 섭렵해 왔던 수많은 성지의 이야기들에 가서 닿고, 장소의 이야기는 어느새 인간과 삶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로 이어진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앙 선조에 대한 이야기의 향연은 한수산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일 것이다.
“강가의 물새가 우는 것일까. 낯선 새소리가 들려왔다.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면서 생각했다. 최양업도 저 새소리를 들었으리라. 저 바람 소리를 들었으리라. 빗발이 야자수를 때리고 가는 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리라.”
_3부 중 5. 마카오를 떠나서, 223쪽.
한수산 작가가 순례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작은 에세이처럼 다가온다. 중국의 애국 교회로 알려진 츠펑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대리와의 피곤과 서글픔을 동반한 조우, 그럼에도 끝까지 순롓길을 함께하며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준 동행들, 마카오 여행지에서 만난 찰나의 인연이 선사한 성 요셉 신학교 박물관 옥상에서의 휴식, 천호 성지에서 이어진 인연의 도움으로 얻은 롤롬보이에서의 작은 피정, 한수산 작가의 글에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오랜 고뇌에서 나오는 희망은 물론, 순례 과정에서 만나는 사소한 난감함과 즐거움까지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님 댁의 반짇고리 사이에서 어린 손주들을 기다리는 색색의 종합 사탕 세트와도 같은 다정한 행복의 맛이다.
“전시된 자료들을 오가며 무언가를 골똘히 적고 있는 나를 내내 지켜보던 직원이었다. 무거운 카메라와 가방을 자신에게 맡기게 한 그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손짓을 하며 나를 데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층인가, 꺾이고 또 꺾이는 계단을 올라간 그가 머리 위로 난 덧문을 열면서 나를 올라가게 했다. 얼굴을 들이밀며 올라서니, 그곳은 지붕 위였다. 올라가서 편하게 앉아 있으라면서, 그는 담배나 한 대 피우라는 손짓까지 했다. 갈색 기와지붕 위에 올라가 앉으니 거리의 지붕 너머로 멀리 마카오의 또 다른 모습이 바라보였다.”
_3부 중 3. 6월에 찾아간 머나먼 그곳 , 178-1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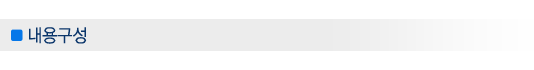
추천사
책머리에
1부 나의 새벽길
나는 왜 그 새벽길을 갔는가
2부 브뤼기에르 주교의 새벽길
1. 브뤼기에르 주교, 그분은 누구인가
2. 이제 떠나며
-먼 그곳으로, 그분의 자취를 찾아서
3. 토굴 속에서 만나는 브뤼기에르 주교-시완쯔西灣子에서
4. 츠펑赤峰으로 가는 길
5. 선종지 마찌아즈馬架子에 서다-그분의 묘비가 있는 동산 천주당(성당)
6. 100여 년이 흘러서…유해가 돌아온 길-압록강에서
3부 최양업 신부의 새벽길
1. 빛의 갑옷을 입고-압록강에서
2. 길은 안개 속에 묻히고
3. 6월에 찾아간 머나먼 그곳-마카오澳門에서
4. 최방제에게 바친다-먼저 떠난 그의 안식을 위하여
5. 마카오를 떠나서-필리핀, 롤롬보이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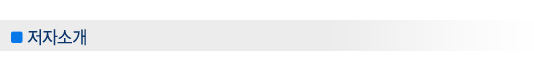
글쓴이 : 한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