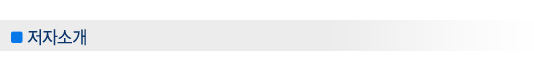“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허리를 숙이는 일, 몸을 낮추는 일, 겸허해지는 일…
시력(詩歷) 41년, 김용택 시인이 온 생을 다해 골몰해온 일에 대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의 보편적 삶의 모습을 절제된 언어와 서정적 인식으로 담아 오랜 시간 독자의 삶을 다정히 어루만져온 김용택 시인. 그의 열네번째 시집 『모두가 첫날처럼』이 문학동네시인선 191번째 시집으로 출간되었다.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성과를 이루었다 평가받는 첫 시집 『섬진강』 이후 ‘섬진강 시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 서정시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한 지 올해로 41년, 짧지 않은 시력(詩歷)은 열네 권의 시집과 더불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콩, 너는 죽었다』 등의 동시집과 8권으로 이루어진 산문집 『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 촌철살인의 시 감상평을 담아 시의 장르적 문턱을 낮춘 『시가 내게로 왔다』, 필사 시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등 시를 ‘쓰는’ 사람이자 시를 ‘살고’ 또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목록들로 촘촘히 채워져 있다.
『나비가 숨은 어린나무』 이후 2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는 고희를 훌쩍 넘긴 시인의 삶에 대한, 앎에 대한 통찰을 한층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 깊어진다는 것은 진실하고 소박하고 소탈해진다는 것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혼잣말 같기도, 편지 같기도, 때로 기도 같기도 한 55편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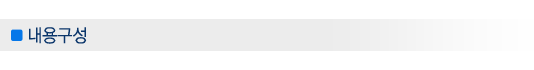
목차
시인의 말
1부 새들은 부러질 나뭇가지로 날아가지 않는다
등이 따뜻해질 때까지/ 쓸 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편지/ 나무에게/ 산앵두꽃/ 오후에는 비가 내렸다/ 기쁜 농부의 노래/ 그 어떤 생각 같다/ 살구를 따서 먹다/ 꽃이 나를 보고 있다/ 마음을 담아 걷다/ 네 별이 다칠라/ 현재의 온도/ 시인의 집/ 우리들의 집/ 내 얼굴/ 조금 더 간 생각/ 아니다, 나비가 잠을 잔다고는 말 못 한단다/ 모르는 얼굴/ 겨울이 왔구나
2부 딸은 내가 밤에 읽은 시를 아침에 읽는다
가을이라고 말 못 해서 겨울로 왔어요/ 새들의 시/ 이끼가 사는 곳/ 생의 순간들/ 슬픔으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별들의 표정을 나는 알아요/ 아침에 인사/ 가을에서 온 사람/ 명랑한 식탁/ 미소를 보내주세요 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놓고/ 모두가 첫날처럼/ 웃으면서 한 걸음 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기억의 노란 날개/ 칸트의 배경/ 우산/ 참새 머리로 들이받기/ 달이 다니는 길
3부 말이 싫은 시가 나는 아름답습니다
봄비/ 이 마음/ 우리들의 꽃밭/ 시인/ 시집/ 아름다운 균형/ 독립된 자유/ 슬픈 역사/ 나비하고 놀다/ 속날개가 다 마를 때까지/ 어디다가 정든 집을 지을까/ 정의의 결과/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 그들 곁으로 걸어가다/ 어느 날도 오늘 같은 날은 없다/ 내 아침의 그쪽/ 달과 걷다/ 다시는, 다시는
발문|나―비(非)의 순리 잡기_오은(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