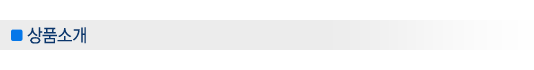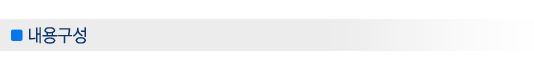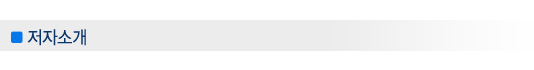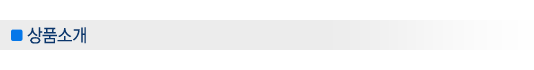
인간적인 몽상가 장자크 상페
창문이 모두 똑같이 생긴 어떤 건물의 앞쪽 면 창가에 한 남자가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그는 새의 몸을 하고 있지만 전혀 날아오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광활한 공간과 자유를 꿈꾸면서도 땅에 붙박혀 있는, 우연성의 함정에 빠진 이상주의자, 그것이 상페 자신의 초상이다.
- 『리베라시옹』, 1991년 12월 26일, 앙투안 드 고드마르의 인터뷰 기사
상페는 1932년 8월 17일 보르도에서 출생했다. 이제 전 세계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의 그림은 소년 시절, 악단에서 연주하는 것을 꿈꾸며 음악가들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려 팔던 상페는 19세부터 만평을 그리기 시작하여 그의 그림을 실어 주는 신문사들을 전전하였으며, 1961년 첫 화집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내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삽화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로 드노엘 출판사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많은 작품집을 출간하였다. 그는 『파리 마치』, 『펀치』, 『렉스프레스』 같은 주간지에 기고해 왔으며, 프랑스 작가로서는 드물게 미국에서도 열렬한 반응을 얻어 『뉴요커』와 『뉴욕 타임스』에도 기고하고 있다.
상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푸근함을 느껴 쉽사리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흡인력을 가지는 그림을 그려낸다. 가냘픈 선과 담담한 채색으로, 절대적인 고립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그리움과 아쉬움을 통해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표현한다. 그의 그림에는 숨 막힐 듯한 이 세상의 애처로운 희생자들이 맑고 진솔하며, 투명한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그런 그림들은 간결하고 위트가 넘치는 그의 글들과 함께 그의 화집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얼굴이 늘 새빨개지는 마르슬랭. 어디에서고 재채기를 하는 르네. 두 아이가 펼치는 행복 찾기 여행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산뜻한 그림, 익살스런 유머, 간결한 글로 사랑받고 있는 장자크 상페의 또 하나의 그림 이야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박한 이웃들의 아픔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내는 상페의 따뜻한 위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녹인다. 삶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태도와 천성적인 낙관이 녹아든,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동화 같은 소설이다.
[줄거리]
꼬마 마르슬랭에게는 큰 고민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
친구들은 항상 묻는다.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
대답하기 귀찮은 마르슬랭은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늘 혼자다.
어느 날 그에게는 친구가 생긴다.
언제나 재채기를 하는 꼬마 르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르네는, 연주 도중에도 수업 도중에도 어디에서고 온몸을 떨며
<에엣취> 하고 기침을 해댄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어딘가 닮은 둘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즐겁고 신나는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도 잠시뿐.
르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마르슬랭은 다시 혼자가 된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마르슬랭, 여전히 얼굴이 자주 빨개진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끊이지 않는 기침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기침 소리의 주인공 르네를 다시 만난다.
이제 어른이 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지는데…….
누구나 하나쯤 안고 살아가야 하는 콤플렉스, 어떻게 콤플렉스를 대하느냐는 가치관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소설에는 늘 빨개지는 얼굴과 끊임없는 재채기가 콤플렉스인 두 아이의 유년 시절이 담담하게 펼쳐진다. 가슴속에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끌어안는 낙천성이 글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그들이 맑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하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소중히 보듬어 안아주며 행복한 한때를 보낸 두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 진정한 우정과 행복한 삶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르치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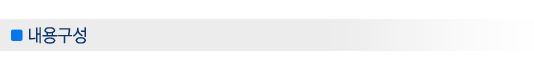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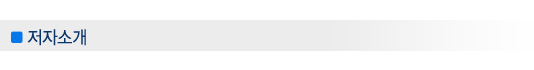
저자 : 장자크 상페
1932년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 악단에서 연주하는 것을 꿈꾸며 재즈 음악가들을 그린 것이 그림 인생의 시작이었다. 1960년 르네 고시니를 알게 되어 함께 [꼬마 니콜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1962년에 첫 작품집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가 나올 때 그는 이미 프랑스에서 데생의 일인자가 되어 있었다. 이후 프랑스의 [렉스프레스], [파리 마치] 같은 유수의 잡지뿐 아니라 미국 [뉴요커]의 표지 화가이자 가 장 중요한 기고 작가로 활동했다. 1960년부터 30년간 그려 온 데생과 수채화가 1991년 [파피용 데 자르]에서 전시되었을 때, 현대 사회에 대해 사회학 논문 1천 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평을 들었다.
[마주 보기] 외에 그의 주요 작품집으로는 [랑베르 씨], [얼굴 빨개지는 아이],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 [어설픈 경쟁], [사치와 평온과 쾌락], [뉴욕 스케치], [속 깊은 이성 친구],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거창한 꿈], [아름다운 날들], [파리 스케치], [겹겹의 의도], [각별한 마음], [뉴욕의 상뻬], [마주 보기] 등이 있다.
옮긴이 : 김호영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조르주 페렉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에서 영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아무튼, 로드무비』(2018), 『영화관을 나오면 다시 시작되는 영화가 있다』(2017), 『영화이미지학』(2014), 『패러디와 문화』(공저, 2005), 『유럽 영화예술』(공저, 2003), 『프랑스 영화의 이해』(2003)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미지의 걸작』(2019), 『겨울 여행/어제 여행』(2014), 『인생사용법』(2012), 『어느 미술애호가의 방』(2012), 『시점: 시네아스트의 시선에서 관객의 시선으로』(2007), 『영화 속의 얼굴』(2006), 『프랑스 영화』(2000) 등이 있다.